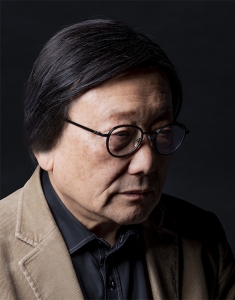형이상적 사유와 아름다운 환상
—정유정 시집 『셀라비, 셀라비』
ⅰ) 정유정 시인은 형이상적形而上的인 사유思惟를 젖은 감성과 서정적인 언어에 녹여 부드럽고 아름답게 착색한다. 그 정서의 결과 무늬들은 환상幻想을 떠받들고 있으며, 안팎으로 번지고 스미는 ‘꿈의 세계’를 가까이 끌어당기거나 그 이상향理想鄕으로 비상하려는 마음에 날개를 단다.
시인은 산중山中의 집 투명한 유리벽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거나 내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현실 너머의 신비神祕와 비의祕義의 세계를 찾아 나서며 끊임없이 꿈을 꾼다. 그 꿈은 지난날과 지금, 앞날에까지 분방하게 길항拮抗하지만, 어둠과 밝음을 넘나들면서 궁극적으로는 초월을 향한 길트기, 무상無常과 포용의 길 걷기로 귀결되는 심상 풍경心象風景에 주어진다.
이 서정적 환상은 푸른빛을 띠거나 무채색을 동반하기도 하고, 끝내 비어버리고 말지라도 바라는 바의 이데아를 향해 열리고 있으며, 상실喪失과 박탈감을 넘어서는 따뜻한 사랑의 회복과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깊숙이 끌어안는 양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ⅱ) 시인의 일상은 거의 산중에서의 삶에 무게가 실리며, 낮보다는 밤이 안겨주는 정서들로 채워진다. 이 때문에 그의 시편들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천착하는 경우가 드물고, 낮이든 밤이든 주로 집에 머무는 동안으로 제한되는 세계와 그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실보다는 자연과의 친화親和나 그 속에서의 꿈꾸기와 자기 성찰自己省察에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산중을 심지어 “길모퉁이의 조그마한 집”(「시월의 집」)이라고 여기는가 하면, 산중의 자연을 내면으로 끌어들여 온갖 느낌과 생각들을 투영하고 투사投射한다. 이 같은 시선과 시각은 거대한 자연(산)도 그만큼 친밀하게 시인과 밀착돼 있다는 뉘앙스로 읽히게 하며, 그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시인의 서정적 자아自我가 내면화(세계의 자아화)하고 주관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이 사는 산중은 “그 집에 울긋불긋 그 산이 산다 / 시월 그 집에 내가 산다”(같은 시)는 구절이 말해 주듯, 산이 산의 집이 되고 산이 ‘나’의 집이 되어 주는 ‘자연’과 ‘나’의 일치一致의 세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게다가 시월의 집(산)에 사는 산은 울긋불긋 단풍들고 ‘나’도 같은 처지이므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일체감을 보여 주기도 한다.
「창 1」에서와 같이 시인은 그 산중 집의 창 안에서 바깥으로 눈길을 주면서 “저 사각의 창밖으로 / 얼마나 많은 구름이 지나갔을까요? / 얼마나 많은 바람이 / 창을 흔들며 지나가고 눈은 또 / 얼마나 포근히 창가에 머물었을까요?”라고, 지나가는 세월의 무상無常과 허무虛無를 담담하게 떠올린다. 그 흐르는 세월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지나가는 구름과 화자 가까이 창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 포근히 창가에 머물던 눈이 암시하듯이 다채로운 빛깔과 무늬들로 미만해 있다.
또한 창 안으로는 “푸르스름한 새벽”이 오고, 햇살 가득한 한낮엔 “노란 졸음”이 밀려오며, 창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밤이 오면 “두꺼운 커튼”을 드리우고 내면의 길로 깊숙이 들게도 된다. 이같이 시인은 바깥세상의 흐름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내면 성찰內面省察로 눈길을 돌려 시간의 흐름이 아름답든 그렇지 않든 창을 비우고 마음도 비게 하는 허무나 무상과 마주한다. 하지만 이 비움은 좌절과 좌초가 아니라 다시 채우고 일어서기 위한 예비동작이 아닐 수 없다.
「창 2―바다로 가는 길」에 묘사되는 바와 같이, 때로는 바깥세상을 “벚나무를 거느린 아름다운 길”로 바라보고, “모든 길 끝에는 바다가 있다고요”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그 길을 “열흘쯤 가다 보면 바다에 닿을“(같은 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산중 집의 방에서 창을 통해 바깥세상을 끌어들이고, 이상향理想鄕과도 같은 꿈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에 불을 지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 안’(현실)에서 동경하는 ‘바다’(이상 세계)는 ‘몽환夢幻의 뜰’을 벗어나고 “또 무엇이 구름처럼 흘러와 / 창 안의 나를 불러 줄” 때라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 그 동경과 현실의 괴리감을 시사示唆한다. 게다가 현실보다 비현실(환상)의 세계, 꿈의 세계에서는 동경의 대상이 여전히 멀고 소멸의 숙명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한결 아름답게 그려진다는 점을 흘러보지 말아야 한다.
“한밤중 꿈결에 창밖을 본다 / 알 듯 알 듯 희미한 웃음 남기고 / 가을 달님이 간다”로 시작되는 「잠과 꿈」에서 시인은 창문 앞에 머뭇거리며 서 있는 늙은 솔(소나무)을 자신(화자)의 처지에 비춰보기도 하고 “하늘은 여전히 멀다”고 토로하면서
금빛 달님 아직도
서쪽으로 간다
서로 어여쁘다고 말하던 꽃들도
깊은 잠에 들었다
처연한 달빛만 방안에 소복한데
환히 열린 꿈속 얼굴
고쳐 벤 베갯머리에 선명하다
—「잠과 꿈」 부분
고, 기울고 있는 달의 모습을 신비와 비의의 대상으로 미화한다. ‘달’에 ‘금빛’이라는 관을 씌우고 ‘님’이라는 존대어를 쓰고 있을 뿐 아니라, 달이 소멸을 향해 흘러가는 모습을 ‘아직도’라고도 수식한다. 게다가 서로가 어여쁘다고 예찬禮讚하던 꽃(생명의 절정)들이 잠들었는데도 처연한 빛을 비추며 하염없이 하늘(허공)에 떠가는 달을 “환히 열린 꿈속 얼굴”로 신비화하고 “고쳐 벤 베갯머리에 선명하다”고 치키고 있다.
‘반달’ 모습 역시 ‘금빛’으로 바라본다. 또한 반달을 ‘고르게 뛰는 심장’으로 인격人格을 부여해 격상시키는가 하면, 반달이 떠오른 그 ”덧없이 아름다운 시간”(「붉은 양귀비」)이 잠 못 이루게 하고, 시인(화자)의 심경心境을 한낮에 본 붉은 양귀비가 눈가에 어른거리게 한다고도 그린다. 더구나 반달이 촉발하는 시인의 간절한 심경이 양귀비꽃의 모습으로 전이轉移되고 비약된다.
이제라도 사람 껍질 벗고
꽃이 되어 볼까
발갛게 달아오른 달빛으로
양귀비꽃 덮어주고
그 빛깔처럼
무명천에 자리한 어여쁜 나의 꽃,
곱게 감싸
아주 먼 시간으로 보낸다
—「붉은 양귀비」 부분
시인은 심지어 사람 껍질을 벗고 양귀비꽃으로 변신하고 싶어지며, 달아오른 달빛으로 양귀비꽃을 덮어주고 곱게 감싸 안아 아주 먼 시간으로 보내게도 된다. 고르게 뛰는 심장인 반달은 이윽고 시인이 ‘나의 꽃’으로 명명하는 양귀비꽃과 짝이 되고 하나가 된다.
하지만 이 시를 또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붉은 양귀비가 여성성의 상징象徵으로 읽을 수 있다. 여성이 치르는 생리현상과 그 피의 빛깔을 ‘발갛게 달아오른 달빛’과 ‘양귀비 꽃빛’에 비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무명천에 자리한 어여쁜 나의 꽃”이라고 시들지 않은 여성성을 기꺼워하면서도 그 생리현상의 끝에 이르러 “곱게 감싸 / 아주 먼 시간으로 보낸다”고 아쉬워한다. 그의 시는 이같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복합성과 애매성을 거느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의 시에는 ‘천사天使’가 이따금 등장하는 점도 주목된다. 「내 안의 천사」에서 그려지듯이, 시인을 찾아온 천사는 커다란 자루를 내려놓고 곁에 앉기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털복숭이 같은 머리카락을 풀어놓으며 자신에게 기대어 쉬는 모습으로도 묘사된다. 게다가 “그가 옷을 털고 내게서 떠날 때까지 나는 산 속에 머물러야겠다 산중 어둠과 슬픔 가득 찬 그의 자루를 보듬고 여기서 나도 쉬어야겠다”고도 한다. 시인에게 천사는 이같이 범상凡常한 의미를 벗어나 있으며, 가여운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시인에게 자루 속에서 해묵은 봄을 가져다주는 그 ‘누더기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눈보라 속에 붉게 떠오르는 태양”(「눈보라 속 태양」)으로 환치換置된 ‘진정한 자아’이고, 일상적 자아로서는 ‘가여움의 대상’이기도 한 것으로 그려진다.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
가여운 천사!
찬바람이 두께를 더하는
바깥세상 말해주고 싶은데
봄꽃 푸른 숲 붉은 낙엽 지나
또 눈 쌓인 겨울,
“이제 가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는 나를 홀로 두는 걸
온 세상 아픔으로 아는지
먼 하늘에 비치는 사각의 창 안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다
—「사각의 창-산중 일기 9」 부분
이 시에서도 느끼게 되듯이, 시인에게 천사는 ‘천상적인 영적 존재’라기보다 ‘진정한 자아’, 세속적 자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참된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시인은 천사가 자신을 가엽게 보기보다 자신이 천사를 가엽게 바라보는 점은 눈여겨보게 한다. 이 같은 시각은 진정한 자아에 이르지 못하는 비애의 다른 표현일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런 지향의 역설적逆說的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인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 한겨울이 왔는데도 날아가지 않는 천사를 자신과 함께 사각의 창 안에 갇힌 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그리는 건 “나를 홀로 두는 걸 / 온 세상 아픔으로 아는지”라는 대목이 암시하듯이 진정한 자아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인은 그 비애悲哀를 ”먼 하늘에 비치는 / 사각의 창 안“이라고 표현하며, 그 지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決意까지 완곡하게 내비치고 있다.
ⅲ) 시인은 사계四季 중에서 봄과 가을을 각별히 선호하며, 봄보다도 가을을 더욱 친근하게 여긴다. 바닷가에서 성장한 탓인지 봄철 “해변의 풀밭은 / 다른 곳보다 더 새파”(「고도孤島」)랗다고 느끼며, “선하고 상냥한 연둣빛 / 재스민 라일락 오렌지 / 천 가지 새 꽃 품은”(「빛, 그 오후의 흔적」) 봄에는 “아침이면 활짝 피어날 꽃, 이슬, / 치맛자락 가득 싱싱한 봄날 오후의 / 내 빛이, 내 소리가 들려”서일까. 내리는 비도 그 봄이 품고 있는 꽃의 빛깔과 그 향기 등을 다치게 할까 보아 우려해마지 않는다.
간밤 서늘한 비에
내 꽃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룩지고 쳐진 몸이
한밤을 지나
다시 꽃처럼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밤사이 내린 비처럼 아픔도
잠깐만 왔다 갔으면 좋겠다
—「비의 정원」 전문
이 시에는 피어 있는 꽃들을 “내 꽃들”이라 여길 정도로 꽃들이 훼손될까 우려하며, 비(=아픔)도 잠깐만 왔다 가고, 자신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잎과 꽃이 피고 수많은 벌레들이 기거하고 / 향기로운 바람이 가득 차 있던 정원”(「고요한 정원」)을 기억 속에 소중하게 갈무리한다. 나아가, 오래 기다려 잠시 필 꽃을 보게 되더라도 꽃을 심으려 하며, 한때 피었던 꽃 같던 자신이 누군가가 다시 피어나도록 해 주고 그 누군가가 꽃이 된 자기에게 깃들려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꽃은 시인에게 생명력의 절정絶頂과 사랑의 상징이다.
지는 꽃 보기 싫다 하고
어찌 꽃을 심지 않겠나
열흘 피는 꽃 보려
일 년을 기다리지 않겠나
한때 나도
어여쁜 꽃으로 핀 적 있었으니
누군가 나를 다시 심어
꽃으로 피워 주려나
그리하여 ‘네가 내게 깃들기를’
하고 말해 주려나
—「다시 꽃에 깃들다」 전문
한편 시인은 서늘한 비바람이 부는 ‘비의 정원’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정원에는 / 낙엽이 쌓이고 봄바람이 불고 / <중략> / 저 고요한 정원의 눈 위에 / 또 무언가를 심으려 한다”(「고요한 정원」)면서, 모든 사물들이 온전하게 제 빛깔과 향기, 소리들을 그대로 거느리는 고요한 정원이기를 바란다.「스무 살에」에서도 “머릿속 말갛게 비우고 /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어 하듯,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며 젊음(생명의 절정)을 구가謳歌하던 때로 회귀하고 싶어 한다. 이 같은 목마름은 “테라스 건너 푸른 보리밭이 보이는 집 / 둥근 기둥에 기대어 / 그 밭 사이 길로 달려가는 꿈”(「깨끗하고 하얗고 예쁜 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 탓일까. 시인은 유독 조락凋落과 적막의 계절인 가을을 선호한다. “눈부신 가을이 옷자락을 적”시면 “팔을 걷고 두꺼비처럼 엎디어 / 빈 유리병 속의 세상을” 보고, “투명하게 반사돼 찰랑이는 / 황홀한 바다”(「유리병 속 오후」)와 조우하는 환상을 소환召喚한다. 또한 그 “가을 바다의 / 꿈같은 정적에 빠”지면서 “가을 안으로 녹아드는 / 유리병 속 오후”에 마음을 부려 놓기도 한다. 역설이겠지만 시인은 또한 시월이 오면 곧바로 십일월을 기다린다. 그 십일월은
단풍이
바람을 부르지 않고
조용히
사뿐히
참 아름답게
떨어진다
—「십일월 2」 전문
는 아름다움 속이기도 하고, 거기로 취해 비틀거리며 가게 되는 건 “낙엽 쌓이면 문이 열리는 집, / 가을이라는 집”(「만취, 만추」)이 맞이해 주기 때문이며, 「십일월 1」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제라늄 빨간 꽃들이 해를 먹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쉬게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더욱이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 스물두 번째 곡인 ‘노악사’와 마지막 곡 ‘백조의 노래’를 각별히 좋아하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단풍이 금방 낙엽 되는 산중
골짜기 풍경을 스치는 바람이
노악사의 고단하고 슬픈
선율과 닮았을까
그 바람을 타고 오는
십일월 차가운 향기에 온몸 흔들면
그리운 무언가가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
<중략>
그의 몸에 든 병을 아파하고
마음의 암흑을 견디어주고
해마다 십일월,
먼 여행 떠나는 그를
내 따뜻한 품에서 배웅하고……
조그마한 의자에 홀로 앉아
오래오래
백조의 노래를 듣는다
—「십일월, 슈베르트」 부분
천사를 꿈꾸고 자신의 진정한(참된) 자아를 천사에 비유하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낳고 병고로 세상을 떠난 슈베르트의 고단하고 슬픈 생애에 흠모欽慕와 연민憐憫을 보낸다. 그것도 그가 떠난 십일월에 그의 슬프게 아름다운 음악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고, 애달픈 생애를 떠올려 마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한 천사처럼 따뜻한 품에서 배웅해 주고도 싶어 한다.
ⅳ)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시인의 정한情恨의 정서는 그리움과 젖은 연민을 거느린다. 그 정한의 정서는 가족에 대해서는 물론 가까웠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확산된다. 「아버지는」에서 시인은 아버지를 “금빛 노을의 새벽 바다가 천계의 빛깔이라고 하는, / 바다를 통째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러러 그린다. “나를 내려주고 떠난 기차처럼 /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으세요”라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떠나버린 기차에 비유하면서 이 세상에 내려진 자신의 돌아보며 그리움에 젖는다. 이 같은 그리움은
대문 활짝 열고 반기던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다
개울물처럼 예전에, 예전에
먼 곳으로 흘러가 버리셨다
—「그리운 것들」 부분
는 상실의 아픔과 절절한 연민을 대동하며, 어머니를 향한 환상은 “하얗고 작은 나비가 기웃거리는 책상 위에서 /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는 접어 / 집 앞에 선 빨간 우체통에 넣”(「나비, 어느 날의 혼돈」)는 안타까움으로 묘사된다. 어머니가 책상 위에 날고 있는 “하얗고 작은 나비”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사랑을 소환한다. 이 같은 환상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의 헤어짐에 대해 “이 기막힌 끈은 잘라 버리면 더 튼튼한 새 줄이 /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 법원 문 앞까지 갔다가 또 되돌아 왔다”(「끈끈한 끈」)면서도
결국 남의 편이 죽고 난 뒤 여자는
대문도 걸어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내리 사흘 동안 푹
잘 자고 나왔다
—「끈끈한 끈」 부분
고 역설한다. 애증愛憎과 정한으로 얽힌 ‘끈끈한 끈’은 영영 헤어진 뒤 사흘간 대문과 방문도 걸어 잠그게 했다고 하면서도, 그 심경을 다른 한편으로는 다 비워낸 듯 푹 잘 잤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이 복합적인 심경에는 분명 “푸른 물 든 사람의 사랑 / 그 아름다운 상처”(「상처」)가 각인돼 있고, “상처가 그어놓은 길 더듬어 / 새로 핀 푸른 제비꽃, / 그 위에 포개진 / 아직도 아물지 않은 사랑 /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같은 시)이라는 여운餘韻을 끌어안고 있다. 이 ‘끈끈한 끈’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도 내비쳐진다.
등이 차갑고 쓸쓸하다
어딘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뒤꼭지를, 장난기 많은 까만 유령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 휙
뒤돌아보는 참 하릴없는 몸짓
한겨울 찬바람 문밖에서 덜컹거린다
뭔가 분명 그릴 게 있는데
백지보다 마음 더 하얗다
밤사이 내린 눈, 사각사각 발자국 남기며
누군가 다녀간 것 같고
—「뭔가 분명히」 부분
사흘간 푹 잤다고 말하지만, 등이 차갑고 쓸쓸하며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휙 뒤돌아보게 되는 건 ‘왜’일까. 찬바람 소리와 함께 밤사이 내린 눈에 누군가가 발자국 남기며 다녀간 것 같이 느끼고, 마음이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워(그려)지지 않은 채 백지白紙보다 더 하얗다고 토로한다. 어쩌면 이 애증은 “가자고 하면 멈추고 잠시 쉬노라면 / 혼자 저만치 가버리”거나 “겨울에 부채질해 주고 / 여름엔 군불 때 주는”(「이율배반」) 사람과의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인은 다시 그 지난날을 거꾸로 뒤집어 보고 싶어지게 되는지도 모른다.
길 위에 쏟아둔 기억을 밟고
별이 진다
그에게로 가고 싶다
지난 시간이 그리운 게 아니라
다가올 시간이 그립다 하고
낯익은 마을 끝집에서
날 기다리는 그가 있을 거라 착각하고
꽃이 되었다가 바람이 되었다가
그에게서
덤으로 받은 위태롭던 시간을
사랑이었다고 착각하고
별이 지는 솔길 따라
그에게로 가고 싶다
—「착각하기」 전문
시인은 이 시에서 “그에게로 가고 싶다”고 되풀이해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마음(그리움)은 지난날 “그 길 위에 쏟아둔 기억”들 때문이기보다는 헤어져서도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일말一抹의 기대감(미련) 때문으로 보인다. ‘낯익은 마을의 끝집’은 그와 함께 살던 집으로 지난날과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가올 시간에는 새로이 함께할 공간이며 ‘위태롭던 시간’도 넘어서는 사랑의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은 그런 '바람'(소망)을 ‘착각錯覺’이라며, 별이 지는 캄캄한 솔길을 따라 그에게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나 기실은 그 ‘착각’이 미련과 그리움이 빚고 있는 ‘바람’이다. 이 착각하기는 그대로 착각이라기보다 착각하기가 착각이기를 바라는 심경이 은밀하게 자리해 있으며, 그런 바람을 완곡하게 내비친다고도 볼 수 있다.
「미안하세요」에서의 “창 아래 꽃을 피워놓고 보라하니 / 고개를 돌리더군요”라든가 “유리벽 속에 / 혼자 갇혀 있나요”, “꽃에게, 내게 할 말이 없나요 // 뭔가 중얼거린다 해도 / 미안하다는 말은 / 할 줄 모르겠군요”라는 대목과 「얼음사람」에서의 “얼음옷을 벗고 / 내 발소리를 가져가요 / 그렇게 오늘은 / 따뜻한 사람으로 있어요”라는 구절句節 역시 그런 바람과 맥脈을 같이한다.
연작시 「나의 천국에 그대가 없다」도 ‘그대 부재不在’의 아픔을 절절하게 노래한 시편들이다.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천국天國’으로 보고, 그 속에서 참된 자아로 살아가려는 자신을 ‘천사’로 보는 듯한 이 연작시는 시인의 내면의식을 승화시켜 보인다.「죽은 남자를 위한 파반—나의 천국에 그대가 없다 3」에서 “가슴을 두드리면 울던 그는 / 이제 천국에서 /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을까”라며 “이제 나의 천국에는 그대가 없다”고 토로한다. 여기서는 ‘그대’도 연옥煉獄이나 지옥地獄이 아니라 최상의 저승인 천국(천당 또는 극락)에 있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그 정황은 이 연작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발아래 지천 꽃대 떨구며 그는 다른 세상,
먼 곳으로 떠나가는데
‘잘 가세요’라는 말 대신
검은 치맛자락을 깔고 손 흔들었다
<중략>
정지된 시간을 벗어나
캄캄한 밤을 건너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정지된 밤을 건너다—나의 천국에 그대가 없다 1」 부분
별이 된 이를 찾아 떠났으나
내가 따 온 별에는
나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유령처럼 또 침묵하고
더 깊은 생각에 골똘하다
자정을 넘겼습니다
—「별이 된 이를 찾아—나의 천국에 그대가 없다 2」 부분
“‘잘 가세요’라는 말 대신 /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운을 떼는 「정지된 밤을 건너다」에서 시인은 그대가 발아래 지천 꽃대 떨구며 먼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가 간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정지된 시간을 벗어나고 캄캄한 밤을 건너갔지만, 이와는 사뭇 대조적인 발아래 지천 꽃대를 떨구며 갔다는 것이다.
이 시의 화자 입장에서 보면, 그의 떠남이 어둠을 벗어나고 건넜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밝음을 떨구고 떠났다는 뉘앙스도 거느린다. 하지만 어쨌든 자신과 더불어 살던 세계와는 다른 곳으로 떠났으며, 자신이 꿈꾸는 세계에는 그가 부재한다는 안타까움이 녹아들어 있다. 설령 그가 천국에 갔더라도 자신의 천국은 떠나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도 한다.
한편, 「별이 된 이를 찾아」에서는 그가 별이 됐다고 보고 떠난 그를 찾아나서는(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심경을 그리고 있다. 그를 찾아 나서 따온 별에 자신만 있다는 건 그가 별이 되었을지라도 그 별을 결코 만날 수 없고 찾아 나섰던 자신만 되돌아온 천국(꿈꾸는 세계)에서 홀로 그리워할 뿐이라는 비애의 완곡한 표현이다. 이 같은 비애는 자신이 꿈꾸는 세계에서 유령幽靈처럼 침묵을 거듭하고 밤 이슥토록 더 깊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情況을 말해 주고 있다.
ⅴ) 시인이 길을 나서며 마주치는 현실은 꿈꾸는 세계(이상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계시켜 봐도, 어떤 사물을 들여다보아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숨 막힐 지경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연옥에 다름없다. 성장하던 기억을 더듬어 “아무도 없는 / 캄캄한 해변을 거닐면 / <중략> / 내 안에 깊이 가라앉아 / 숨 막히는 기억들 / 그 무수한 뒤척임”(「해변 2」)의 시간이 적막 속의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위에 떠도는가 하면, 그런 정황은 시인에게
여러 갈래로 흩어진 옛길과
어둡고 더딘 밤을 지나온
이 해변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문을 닫으면 될까 또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해변 2」 부분
라는 회의懷疑를 안겨준다. 이 같은 비감悲感은 산에서 나무들 사이의 고사목枯死木을 바라보며 마음을 끼얹는 「하얀 나무」에서는 “숲이 묻어주지 않는 나무송장이 / 내 따뜻한 이마를 짚고 있다면 / 푸드득, 새가 날던 곳조차 /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될까”라는 우려와 안타까움으로 드러낸다. 더구나 그 말라 죽은 나무(나무송장)는 자라다 멈추어 서게 됐지만 “수액을 길어 올리던 길 하나쯤 / 누군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붙들어 놓기도 하고, “저것이, 죽은 것이 / 아직도 아플 게 남아 있는지”라는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난해(2020년) 늦겨울부터 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속의 세상은 가히 연옥에 다름없다.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피하기란 / 우리 어머니들의 / 슬픈 노래를 외면하는 것보다 더 / 어려운 일인 것 같”(「편지 1―코로나 19」)다고 비유하면서도 반성적 성찰과 그 극복을 기구祈求하는 마음을 펴 보인다.
신이 태양의 불꽃으로 지구를
정화하려 하는 걸까요?
긴 후회로 반성해 봅니다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지 않기를 바라도 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모든 이들의 얼굴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라고 기도합니다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시간들을
명랑하고 슬기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지 1―코로나 19」부분
시인은 이 미증유의 환란患亂을 신이 태양의 불꽃으로 지구를 정화淨化하려는 거냐고 겸허하게 물으면서 반성적 자기 성찰을 앞세운다. 세상을 어지럽힌 인간들이 자초한 환란으로 여기는 이 겸허한 자성은 ‘내 탓’이라는 덕목을 받드는 시인의 마음자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어 ‘나’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모든 사람들의 안녕安寧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돋보인다.
이 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편지 2」는 캄캄한 산 아래 좁은 길을 쓸쓸히 걸어가는 듯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포개고 있으며, 방안에 들면 “조용한 노래처럼 방안공기는 부드럽고 / 어린애 같은 마음은 따뜻해”진다고 자기위무自己慰撫도 한다. 그러나 “슬프거나 아프지 않은 이들의 표정도 / 태양을 검은빛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이 / 불안하고 음울”하다고 장기적인 코로나 블루의 이면도 환기한다.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안정과 여유를 회복한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봄 풍경 안에서
밀어 두었던 책 속에 빠져있으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 걱정은 마시고
꼭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계시기 바랍니다
—「편지 2」 부분
이 대목에 이르러 시인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봄 풍경과 독서에 빠져들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평안을 바란다는 인사도 잊지 않는다. 여기서도 시와 사람이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도 해 보게 한다.
시인은 아득한 지난날로 거슬러 올라 희랍 신화神話 ‘오디세이’ 속으로,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 투신한 루마니아 태생의 시인 파울 첼란 생각으로,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인 프란츠 리스트의 광시곡狂詩曲 속으로, 이집트와 싱가포르 (여행 또는 상상여행)로 환상의 날개를 펴면서 개성적인 서정적 자아로 내면을 투영하거나 투사해 그 대상들이 주관화된 장면들로 빚어 보인다.
「술병 속 편지」를 통해서는 “파울 첼란을 사랑하면 가끔은 / 죽음이 영그는 감옥에 갇히고 만다”며, “그의 영혼이 센강 물결을 타지 않았다면 / 나는 아직도 세상의 불안을 몰랐을 텐데”라거나 “유리병 속 파울 첼란의 시詩들만 / 차디찬 소리로 출렁거린다”다고 한다. 또 「불소리 2」에서는 첼란이 “불소리가 싫었을까요? 몸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끄려 했을까요?”라는 궁금증에 빠진다. 이 시들은 자신에 투영된 첼란의 비극적인 생애와 문학, 첼란에 투사한 시인의 내면 떠올리기로서의 추모 헌사追慕獻詞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상에는 추억에조차 낙원이 가까이 있지 않다. 「이집트의 추억」에서와 같이, 옛 왕궁과 신전 안에서 왕비 네페르타리처럼 그윽하게 앉아 봐도, ‘그대’가 떠나버린 세상이 그렇듯이, 람세스가 없는 이집트는 쓸쓸할 따름이다. 돌아와서 그 추억들을 되살려 봐도 “만지면 영혼조차 부스러질 것 같은 / 모래도시에서 본 푸른 배경 / 먼 세월 거쳐” 오기도 하지만 역시 사진 속에 멈춰 있을 뿐이다.
싱가포르도 외롭고 쓸쓸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와 비와 비나무와 / 거리의 사람들과 일렬로 서서 / 온종일 그를 기다렸”으나 “그를 부를 수 없었다 그에게는 /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었”(「비나무Raindrop tree」)을 뿐이고 ‘그의 부재’는 어디로 가나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셀라비」에서는 수직으로 내리는 비를 가지런히 늘어뜨린 비단실로 묘사하면서 자신도 “마냥 고요히 내리는 / 비이고 싶다”고, 비도 비단실같이 고요하고 아름답게 내리는 때(그런 세상)에 머물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처지는 저문 길 위의 세찬 빗줄기 속이며 “늙은 사람은 더 늙은 / 나무에 기대 비를 피하려” 한다고 인생人生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사는 일, 곳곳에 구겨 넣어진 / 아픈 시간이라는 걸”(「아프지 않은 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시풍의 무곡舞曲을 소재로 한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곡 ‘헝가리안 랩소디’를 들으면서는
베어진 풀잎처럼
모로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허수아비의 오후 시간
마르고 음울한 시인의 노래와
피 흘리는 허수아비의 랩소디를
견디지 못하고 나는 도망쳤다
—「어떤 랩소디」 부분
고 고백한다. 슬펐다가 기뻤다가, 정념情念에 사로잡혔다가 이내 다 내려놓은 것처럼 초월의 경지에 드는 듯한 이 곡 중에서 원시적이고 격렬하게 빠른 리듬 부분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시인은 고요하고 아름다우며 부드럽고 따뜻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Lost Paradise」는 바로 이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으로 읽힌다.
지는 해를 배웅하고
다시 올 아침 해를
행복하게 기다릴 것이다
투명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서로 머리카락을 땋아 주거나
꽃그늘에 앉아 사진을 찍거나
샘물에 발 담그고 가슴을 포개어
심장이 뛰는 걸 느낄 것이다
새로운 이타카를 찾아 떠났지만
앞선 사람들은 난폭한 고함소리를 남기고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상을 앞세워 그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달빛도 그곳에만 머물러 밤은
사뭇 꿈같을 것이다
—「Lost Paradise」 부분
이 시는 어떤 것이 낙원이며, 낙원을 잃어버린 비애가 어떤 것인지도 말해 준다. 인간이 추구하는 낙원은 이상향(이타카)이지만, 시인에게 그 이상향은 신기루 같아서 지금․여기서는 ‘아득한 옛꿈 같은 밤’이 곧 낙원과 같은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밤보다 다시 오는 아침과 투명한 노래, 서로 머리카락을 땋아 주거나 함께 꽃그늘에 앉으며, 샘물에 발 담그고 서로 가슴 포개어 심장 뛰는 걸 느끼는 때가 ‘낙원의 시간’이다.
시인은 잃어버린 낙원을 향해 산중의 집 사각의 창 안에서 그 너머의 세계를 부단히 꿈꾸고 있으며, 그 꿈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어쩌면 현실이 외롭고 삭막하고 비루鄙陋할수록 더욱 그럴는지도 모른다. 겸허하게 꿈꾸는 그 세계는 고요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공간이며, 그리운 사람들과 더불어 가슴 포개며 살고 싶은 세상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