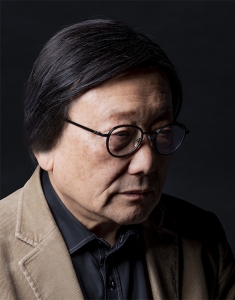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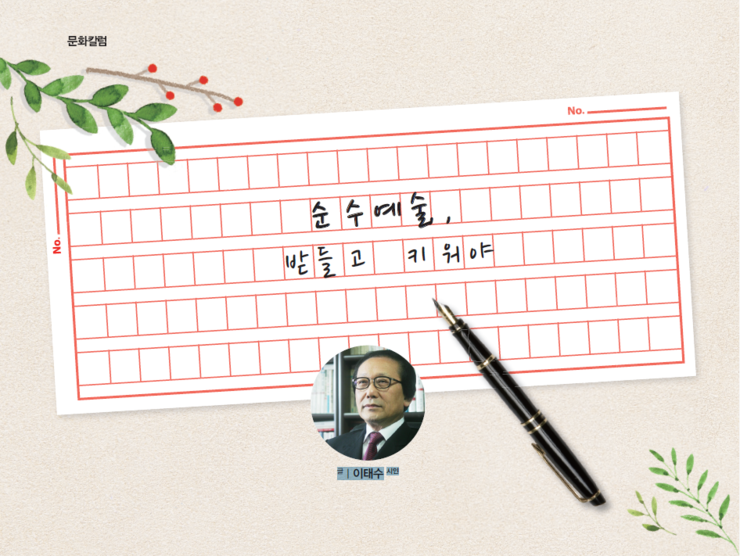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카뮈는 “문화, 그것은 운명 앞에서의 인간의 외침”이라고 했다. 문화를 창조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예술가는 독창성과 진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을 잉태하고 낳는 사람이다. 하지만 예술가로 순수하게 살아남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두히그는 창의성을 높이려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라.”고도 권한다. 이는 창작의 한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창작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설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말과 행동은 그럴듯한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물건을 ‘사이비(似而非)’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짝퉁’이고, ‘가짜’다. 정교한 짝퉁은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고, 때로는 버젓이 진짜 행세를 한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만들어진 과정과 그 속에 담긴 정신이 전혀 다르다. 진짜에는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고, 고통스러운 삶과 그 고뇌가 투영돼 있다. 가짜는 겉모습만 진짜를 닮게 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차지하려 한다. 예부터 ‘예술을 하면 가난하게 산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예술을 할 수 있다.’고도 한다. 두 말을 함께 들여다보아도 ‘예술 자체는 돈과 거리가 멀다.’는 말로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은 순수예술만 겨냥하고 있다.
‘순수’는 깨끗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것을 뜻하므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그런 예술을 하면 돈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게 마련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예술가가 ‘돈방석’에 앉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극소수를 제외하면 상업성을 띠는 예술가라야 돈과 인연이 이어질 수 있다. 문인들은 특히 그렇다.
프랑스의 국민작가 빅토르 위고는 다작으로 유명하다. 아침마다 시 100행이나 산문 200장을 썼다고 한다. “말이란 동사(動詞)이며 동사는 신(神)이다.”라고 했던 그는 언어의 천재답게 시인, 소설가, 극작가로 19세기에 활동했던 ‘전방위문인’이었다. 소설 『레 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꼽추』 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시를 썼다. 그가 쓴 시가 무려 1만 편이 넘는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내게 제왕의 홀(笏)이 없는 게 무슨 상관이더냐. 내게는 펜이 있다.”고 했던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볼테르도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엄청난 양의 작품을 썼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보다 빨리 쓸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은 펜이 필요했을 것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문인 가운데는 다작 작가가 적지않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많이 쓸 수 있고, 널리 읽힐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다작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빅토르 위고는 “대중에 영합하는 다작의 통속소설 작가였고, 인격적으로도 허장성세가 심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사르트르는 볼테르를 “자기와 상관도 없는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정의를 한 바 있다.
다독 다작 다상량
한국에서의 다작왕은 소설가 방인근과 시인 조병화였다. 방인근은 무려 69권의 작품집을 냈다. 정을병, 이병주, 정비석, 이청준, 한승원, 최인호 등도 50권 이상의 작품집을 냈다. 시인으로는 조병화가 93권으로 압도적이다. 고은, 신동집, 황금찬, 김남조, 서정주, 박두진 등도 다작 시인으로 꼽힌다. 이들 가운데 방인근이 주로 통속적인 대중소설을 쓴 건 돈때문이었을 것이다. 정을병, 이병주, 정비석도 문학의 순수성을 지켰다고는 보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청준과 한승원, 돈도 많이 번 최인호는 문학의 순수성을 겨냥하면서도 비교적 폭넓은 독자를 가진 전업작가들이다. 소설가들과는 달리 시인들은 대중적 교감이 잘 돼 독자가 많은 경우에도 돈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시인들이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시만 써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계는 직업으로 해결하고, 삶의 무게중심은 시에 두는 이중생활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송나라 때의 구양수(歐陽脩)는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려면 ‘다독 다작 다상량(多讀多作多商量)’ 등 이른바 삼다(三多)가 필요하다고 했다. 작가나 시인들이 이 요건을 갖추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명한 작가나 시인들은 대개 ‘돈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먹고산다. 돈이 따라 붙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시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생계와는 거리가 멀어도 시가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세태가 크게 바뀌었다. 명예 추구나 취미생활에 무게를 싣는 문인들이 넘쳐나는 반면 문학의 순수성과 그 상승작용을 지향하는 문인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학지들도 마찬가지다. 사명감을 가지고 질적인 수준을 지키는 문학지들이 고사상태인 데 비해 상업성에 기울어진 문학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문단을 어지럽히고 있다. 가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를 흔히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더 폭을 넓혀 보더라도 순수예술은 밀리고 상업성을 앞세우는 문화산업들만 융성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심지어 사이비 예술이 순수예술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만은 아닐 것이다.
예술의 본질이 ‘순수’에 있다면, 우리 주변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정진하는 예술가들이 적지 않다면,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에 빛을 뿌리는 촛불과도 같은 예술은 살아남고 사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물욕과 담을 쌓은 채 예술을 향해 열정에 불을 지피는 예술가라도 너무 배가 고프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순수예술을 받들고 키우는 풍토가 아쉽기 그지 없다.
[출처] 문화칼럼_순수예술, 받들고 키워야 / 시인 이태수|작성자 대구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