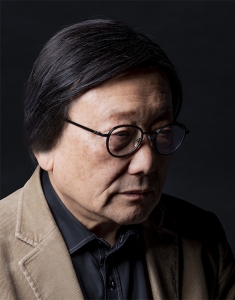오로지 ‘파벌과 친분’——경북신문 2019. 11. 28
“천자(天子)는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습니다. 마땅히 동서(東西)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천자는 사람들에게 편협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장행성(張行成)은 태종에게 이같이 간했다. 태종은 이 신하의 말에 깊이 깨닫고 천자의 길을 걸었다. “천자는 지공무사(至公無私)해야 한다. 관직은 천하인민을 위한 것이므로 오직 현재(賢才)를 선발해 담당시킬 것”이라고 공표하고 실천에 그대로 옮겼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치세로 인정받는 ‘정관(貞觀)의 치(治)’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태종 시대의 재상과 장군은 강남, 산동, 관롱 등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등용됐고, 명문과 서인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독립운동가로 나중에 대통령을 지낸 워싱턴, 제퍼슨, 매디슨 등도 철저하게 파벌(당파)을 부정한 인물들이었다. 워싱턴은 ‘당파 초월’을 신념으로 삼으면서 언제나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매디슨의 경우는 ‘파벌 분쇄’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제퍼슨 역시 ‘파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입지를 다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구하고, 국가 발전의 기틀을 굳건하게 다졌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현실과 인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의 73%가 ‘낙하산 인사’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 임원의 성향을 분류해 사퇴를 종용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장관이 곤욕을 치른 바 있지만, 이 정도로까지 심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은 모두 44명 중 32명이 ‘캠코더’ 인사였다고 한다. '캠코더' 인사란 캠프(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말한다는 건 이젠 상식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캠프 출신이 7명, 민주당 인사가 15명,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10명으로 분류됐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전체 임원 5명 중 4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는데, 4명 모두 캠코더 인사였단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12명 중 9명을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했고, 그중 8명이 캠코더 인사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15명 중 8명을 임명했는데 6명이, 국립공원공단의 12명 중 7명을 임명에 5명이 낙하산 인사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에 우리 사회는 둘로 갈라진 가운데 엄청난 혼란을 겪었으며,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갈등과 우려는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환경부의 ‘캠코더’ 인사는 그 한 예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온 나라가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일간지의 28일자 1면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의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이 만들어진 사건, 전 부산시 경제부지사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의 뇌물 혐의, 제1야당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려는 단식투쟁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다는 뉴스로 메워졌다.
담당도 아닌 대통령 최측근이 정치공작을 해 누명을 쓴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낙마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대통령의 측근을 그 선거에 당선되도록 청와대 공작에 앞장선 대가로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니 기가 찬다. 전 부산부시장의 비리도 정권 치원에서 덮으려 했던 이유와 그 뒷배가 누구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선거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던 야당 대표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돼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기 투항만 요구하는 정부․여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 사회는 지금 원칙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제 몫 챙기기’가 위험수위를 한참 넘어섰다는 우려의 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는 ‘파벌’과 ‘친분’, 오로지 정권에만 혈안이 된 이 삭막한 풍경 속에 언제까지 내팽개쳐져야 할지, ‘정관의 치’는 아득한 옛이야기이기만 한지, 눈앞이 캄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