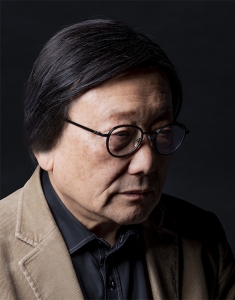따뜻한 문단을 보고 싶다
——경북신문 2020. 7. 29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理想)은 다르지 않다. 가치관이 동양적이든 서양적이든 인류에게 참된 것은 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오직 변하는 것만이 영원한 진리’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한다.
‘진리(眞理)’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실제가 밝혀지고 드러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리는 모든 것을 그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적 지혜의 원형’이라고 했다. 토마스 쿤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를 수반한다’고 말했지만, 진리는 그 원형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의식의 근저에는 선과 악,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자신의 이익, 편의, 쾌락 등에 두는 경향이 짙어지는 느낌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규범인 진리를 밀어내거나 벗어나 자유를 찾으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눈앞의 이익만 염두에 둔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가 진리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혼미가 거듭되고 있어 새삼 진리에 대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재는 철학자들에게 끊임없는 물음의 대상이 돼왔다. 탈근대성과 그것에 도전하고 응전하는 문제를 놓고 형이상학을 위시한 전통철학, 해체주의 등 현대철학을 전공하는 철학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가 거듭돼도 새삼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이 시도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철학계의 큰 과제이면서 혼미에 빠진 이 시대의 ‘화두’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회의는 오랜 옛날부터 거듭돼 왔다. 고대의 회의주의, 근세의 경험론, 근세 이후의 낭만주의, 20세기 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20세기 말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은 서양철학사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철학계는 ‘유행’이나 ‘문화 현상’ 쯤으로 치부하는 분위기였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가짜가 진짜를 지배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가치관의 혼란이 심각하다. 한쪽이 이렇다고 주장하면 다른 한쪽은 그게 아니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를 탓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언어의 경연장’을 방불케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생각을 새삼 해보는 까닭은 ‘진리’에 대한 물음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까지나 절실한 화두로 이어지겠지만, 오늘의 우리 현실은 당장 ‘진리’를 좇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원칙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제 몫만 챙기기’가 위험 수위를 넘은지 오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듯하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패거리’의 이익만 추구하는 ‘삭막한 풍경’ 속에 내팽개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세력 다툼이 날이 갈수록 창궐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요즘 우리 문단에도 파벌과 친분을 축으로 한 패거리 짓기가 극성이라는 말이 들린다. 지난날 문화 권력을 비판하는 진영에 섰던 사람들이 반대로 속속 새로운 문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정치권력에 편승해 문단의 질서를 재편해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심지어 ‘카르텔’을 구축해 자기편만 옹호하면서 헤게모니를 잡으려 한다는 비판의 소리마저 없지 않다.
우리는 1945년 8‧15 광복을 맞으면서 문단이 좌우(左右)로 나뉘어 격렬한 투쟁을 벌였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몇 년간 좌익의 목소리만 높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투쟁이 잦아들었고,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해금이 될 때까지 반쪽 문단이 오래 지속되던 모습도 보아 왔다.
가장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받들어야 할 문인들이 제사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풍토는 아름답지 않다. ‘내’가 우선이더라도 ‘너’도 인정하고 함께하는 포용력을 가져야 하며, 다양성 속에서 문학의 새로운 개화를 이끌어내는 분위기가 성숙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요즘 문단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방 공간’의 아픈 악몽이 떠오르는 건 지나친 기우이기만 할까. 아무튼 따뜻한 문단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