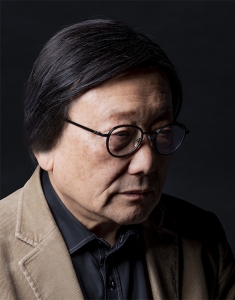뜻글자인 사람 인(人)자를 새삼 들여다본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사람은 누군가와 만나 의지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과 일터, 사회와 나라,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도 규모가 다르지만 그런 공동체다.
그러나 우리의 이 공동체는 '나'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하면 '나'도 '너'도 살지 못한다. 끊임없이 불협화음(不協和音)이 생기고, 다툼이 이어지며, 불상사가 터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해득실(利害得失)을 앞세워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면 '나'와 '너' 사이를 비인간적인 관계로 몰아간다.
대화의 징검다리를 허물 뿐 아니라 서로 헐뜯고 모략하는 적의(敵意)를 부르게 마련이다. 가정에서의 천륜(天倫) 배반, 일터의 불신과 적대행위가 그것이며, 단위가 커질수록 엄청난 비극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개미 구멍 하나가 못둑을 무너뜨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해와 화해 없이 상대를 비판과 비난만 한다면 부정, 혐오, 증오를 증폭시키고, 재앙(災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일찍이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생겼겠지만, 우리 선조들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만나면서 상대의 처지와 형편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미덕을 소중하게 여겨왔으며, 그럴 때의 세상은 대체로 태평성대를 누렸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더불어 살기의 포기'로 가는 느낌이 들게 한다.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위정자들이 '나쁜 데로 가기' 작정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더 말을 보태자면 '산 넘어 산'이요,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 온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정치적 파열음은 예를 열거하기조차 민망스럽다.
힘을 가진 세력이 '너'를 잊고 '우리'를 잊고 있을 뿐 아니라 오로지 '나'와 '내 편'만 내세우며 온갖 무리수를 불사하고 있다면 지나친 말이기만 할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엄혹한 공포 속에 휘말려 있으며, 그 끝이 안개 속이나 다름없는 데다 여전히 민생(民生)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지 않은가. 이런 소용돌이가 과연 언제 진정될 수 있을지, 질식해버릴 것만 같다.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남을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세상 이치(理致)다. 스스로를 준엄하고 냉엄하리만큼 분석하고 비판해 봐야 남들이 드러내는 약점이나 잘못도 끌어안을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가 그런 관용(寬容)의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관용을 실천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권력 장악을 위해 '살기 아니면 죽기'로만 여긴다면 생각해볼 대목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경쟁사회이니까 인정과 이해가 더욱 요구되고, 그것이 잘 구현돼야 번창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죽기로 힘쓰면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역설적인 미덕이 되레 우리가 사는 길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에겐 중성심(忠誠心)도 전통적 미덕이었다. 외국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했다. 따져보면 이런 마음이 허물어져 나라가 더욱 어지러워진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높은 어른에 대한 성실한 순종과 봉사 정신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며, 위와 아래의 상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꼬인 매듭들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늦다고 생각될 때가 빠르다'는 말도 있다. 우리가 더불어 더 잘살려면 '역지사지'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더구나 나라가 어지럽고 심하게 꼬여 있어 그 매듭을 만든 쪽부터 풀어나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가 보태질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는가. 힘이 센 '나'부터 그렇지 못한 '너'와 더불어 살려는 자세로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려는 모습을 간절하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