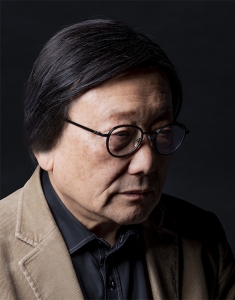시인으로 살아가기
——경북신문 2023. 4. 18
오랜 세월(34년) 신문사에서 일하고 그 가운데 마지막 10여 년간은 대학의 겸임교수로 강단 생활도 겸해 바쁘게 살았으므로 마음속으로는 시 쓰는 일에만 전념할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그 기다림대로 신문사 일을 마감한 뒤에는 어떤 권유나 요청에도 매일 출근하는 일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전업 시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세월도 어언 15년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로 스무 권의 신작 시집을 내게 됐지만, 그중 열한 권은 전업 이후의 시집들이다. 근년(2018년부터)에는 해마다 한 권의 시집을 내다가 지난해(2022년)는 더욱 힘을 쏟아 두 권을 내기도 했다. 자비 출판이 아니므로 출판사의 배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간 감사할 일이 아니나, 시를 너무 많이 쓴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이 물신 시대에 전업 시인으로 살아가는 건 고행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원하기도 하고 좋아서 스스로 택한 길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외로움과 자괴감에 빠질 때도 없지 않다. 일차 생산과는 거리가 먼 시 창작은 ‘밥’도 이렇다 할 ‘명예’도 되어 주지 않으며, 시집을 읽어주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시인은 허공으로 발을 뻗으며 생명을 지탱하고 달구는 풍란과 같은 존재일는지도 모른다.
깊은 밤, 시를 쓰다가/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밥도 안 되어 주는/시를 쓰겠다고, 잘 안 되는 말을 앓고 앓다가/불을 끈다. 다시 켠다./이불을 뒤집어쓴다. 또다시 일어나 앉는다.//자욱한 담배 연기. 허공에 발을 뻗다가/맥없이 발 오그리는 한 포기의 풍란,/담배 연기보다도 부질없는 저 먼지나 티끌들의/떠돎과 목마름. <중략> //깊은 밤, 시를 쓰다가/누군가가 켜 놓은 저 불빛의 흐릿한/흐느낌, 그 언저리를 맴돌고 헤매다가/영락없이 거기가 거기지만, 시를 쓰겠다고/일어나 앉는다. 또다시 이불을 뒤집어쓰다가/불을 켠다. 불을 껐다가 다시 눈을 뜬다.(자작시 ‘깊은 밤, 시를 쓰다가’ 부분)
시를 쓰는 과정과 그 고뇌의 시간을 가감 없이 토로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굳이 걸으려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당연한 물음이다. 시마(詩魔)에 사로잡혀서인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체질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주치는 현실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해 온 것만은 사실이다. 시를 쓰는 까닭을 굳이 한마디로 답해야 한다면 그런 숙명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새삼스럽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듯 지난 시절의 시집들을 들춰보다가 여섯 번째 시집 ‘그의 집은 둥글다’의 표사(뒤표지의 글)에 눈길이 머물렀다. 1995년 당시의 생각이었으니 오래됐지만 지금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육체적 지각을 통하지 않고, 느낌으로만 다가오는 이미지도 소중하다. 상상력이나 환상은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꿈꾸기에 연결고리를 달아주며, 그 꿈꾸기는 시의 뼈와 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꿈은 삭막한 삶을 적시면서 보다 나은 삶을 올려다보게 한다. 그곳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놓아주고, 오르게도 한다.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흔들어주곤 한다. 지금·여기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세계, 어쩌면 영원히 가 닿을 수 없는 세계마저 꿈의 공간에서는 반짝인다. ‘꿈의 공간 만들기, 그 속에서 살기’는 뒤틀리고 추한 몰골을 한 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조그마한 오솔길 트기’인지도 모른다.”
되돌아보면 현실은 언제나 뛰어넘고 싶을 정도로 어둡고 삭막했으며 목마르게 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빛깔이나 무늬가 다소 다르더라도 초극과 초월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내게 시 쓰기는 그런 현실 속에서의 ‘꿈의 공간 만들기’이며, 더 나은 삶과 그 세계를 향한 꿈꾸기다.
하지만 그 꿈의 공간은 언제나 비의(秘義)에 감싸인 채 침묵의 세계에 머무를 뿐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시를 쓰게 되는 건 현실 너머 침묵이 잉태하고 있는 절대적인 말, 신성한 말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이며, 침묵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런 말들을 끌어안고 나오려는 안간힘 쓰기에 다름 아니다. 시시포스의 바위 굴리기와도 같은 이 꿈꾸기를 언제 그만두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