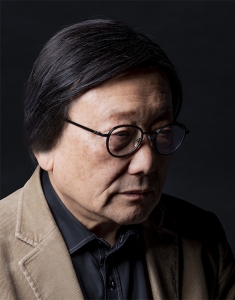
연령별 '호칭' 되짚어보기
어느 날, 한 지기들의 모임에서 연령별 호칭 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오갔다. 잘 아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 대부분이 대여섯 가지 정도의 호칭을 알고 있는 수준이었다.
마흔은 불혹(不惑), 쉰은 지천명(知天命) 또는 지명(知命), 예순은 이순(耳順), 예순하나는 환갑(還甲)이나 회갑(回甲), 일흔은 고희(古稀) 또는 종심(從心) 정도가 그것이었다. 마흔은 사물의 이치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 나이, 쉰은 천명을 아는 나이, 예순은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해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나이, 예순은 한 갑자를 돌아온 나이, 일흔은 뜻대로 행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뜬금없이 ‘켸켸 낡은 이야기냐’는 핀잔을 듣게 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연령별 호칭이 시사하는 바, 그 뜻들은 오늘에 비쳐 봐도 결코 예사롭지 않을 듯하다. 한여름의 청량제 삼아 떠올려본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지기들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수준이었으나, 이 사실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우리는 확실한 걸 알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됐으며, 어렴풋이 알거나 잘 모르던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열다섯은 지학(志學-학문에 뜻을 둠), 남자에 한해 스물은 약관(弱冠)이다. 서른은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고 이립(而立), 마흔여덟은 십(十)이 네 개와 팔(八)이 하나인 글자(桑)로 풀어서 상수(桑壽)다. 일흔일곱은 희(喜)에 칠(七)이 세 번 겹쳤다고 희수(喜壽), 여든은 산(傘)에 팔(八)과 십(十)이 들어 있어 산수(傘壽), 여든여덟은 쌀농사가 여든여덟 번의 과정을 거쳐 쌀이 된다는 데 근거해 미수(米壽)라 한다.
옛날엔 장수하는 경우가 드물었겠지만 아흔이 되면 졸수(卒壽), 거기 한 살이 더해지면 백수를 바라본다는 뜻에서 망백(望百)이다. 아흔아홉은 일백 백(百)에서 한 일(一)을 빼면 흰 백(白)이므로 백수(白壽)이며, 백 살이 되면 최상의 수명을 누렸다는 의미로 상수(上壽)라 했다.
따지고 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이요, 예지 넘치는 의미 부여다. 더구나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잇값은 여전히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화두로 넉넉하게 값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때든 안 그런 적이 있었느냐’는 반문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의 세태가 ‘황량해지기 악화 일로’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 않은가.
일찍 백수(白手)가 된 한 오십대 지기의 한탄처럼, 오십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천명을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해졌을 때는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이기 일쑤인 세상이다. 사람의 수명은 점차 길어지는데 ‘폐기 처분’은 빨라져서 나오는 한탄임은 물론이다.
더욱 서글픈 건 ‘한 갑자’를 돌아온 회갑 때 자축은커녕 숨기려 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면서도, 그 뒤 해가 갈수록 추억이나 반추하면서 살아가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뜻대로 행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일흔에 이르러서는 시간을 죽이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한숨소리가 아프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약관?이립?불혹 또는 그 나이를 넘긴 세대들 역시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등의 신조어들이 사라지지 않듯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사회는 ‘앞뒤곱사등이’가 돼 버렸다고나 할까. 왜 이리 됐는지 모두 자성해야겠지만, 화살을 잦게 맞는 정치?사회 지도자들부터 뼈를 깎는 각성과 분위기 바꾸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날씨가 무더워 한담을 한다는 게 무거운 이야기가 돼 버렸다. 우리 모두 연령별 호칭이 뜻하는 자리에서 화해로, 젊은이와 늙은이가 두루 더불어, 그 호칭의 의미를 증폭시키며 살아 갈 수 있는 날이 하도 간절해서 해본 넋두리로 봐주기 바란다.